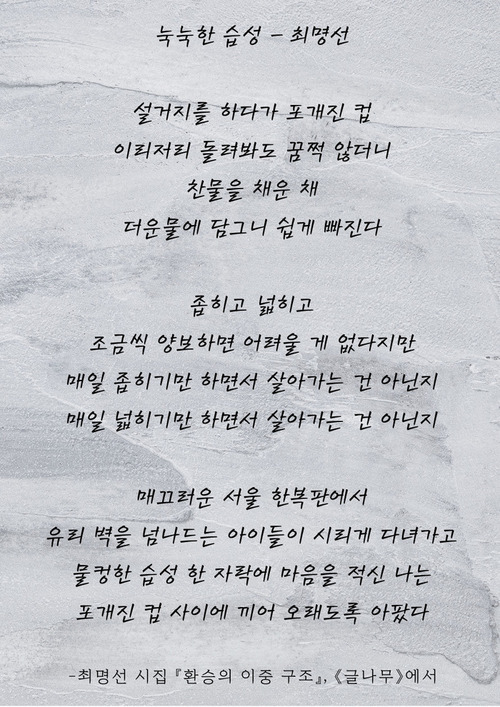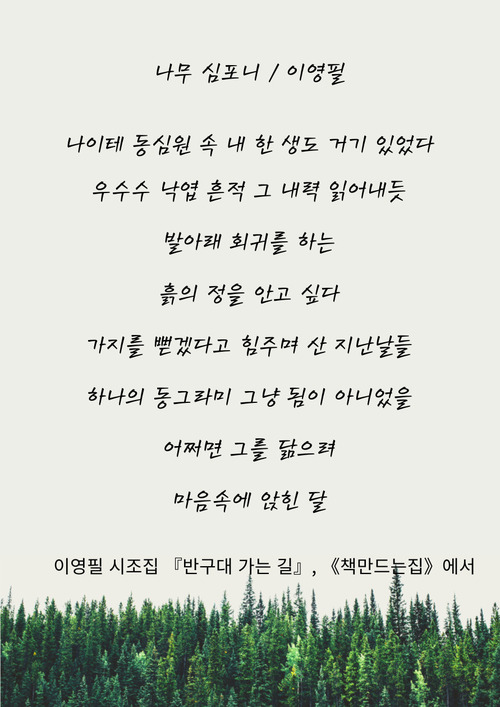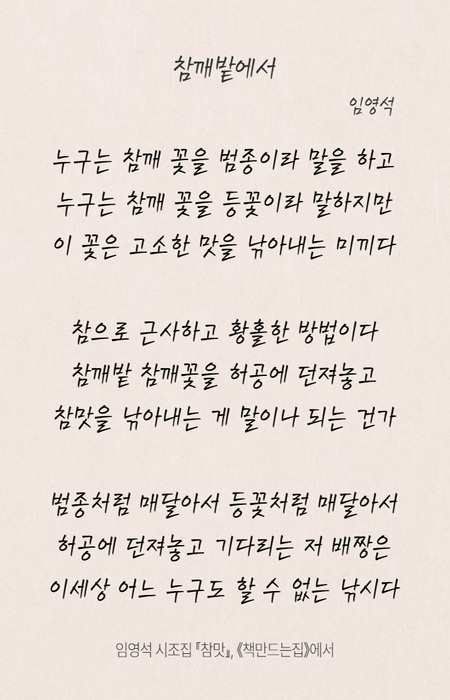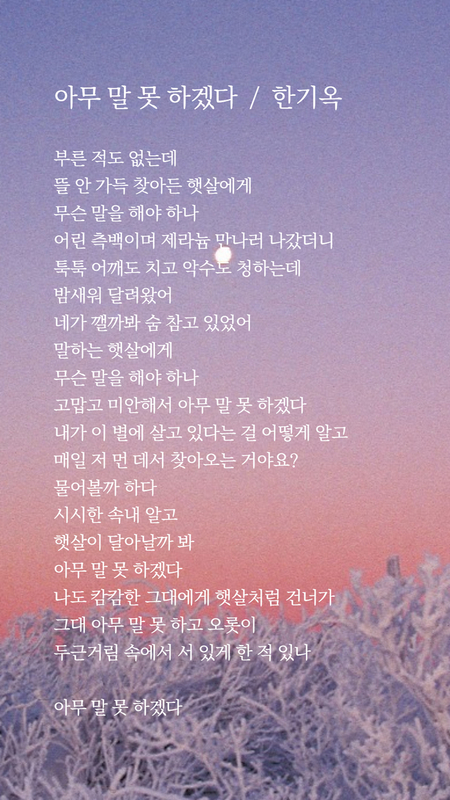댓글
김옥길의 예절산책 관련기사목록
- 개똥벌레와 원숭이 이야기
- 지도자. 매스컴'의 역할
- '말씨' '어휘' 선택을 바르게 들려주자
-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때 아이는 부쩍 자란다
- "어머니" 가 없어지고 있다
- 한국인끼리 편지에 ‘To' 'From'은 온당치 못해
- 택일 할 때의 ‘丁’일은 ‘공휴일’
- '學生' ' 處士' 의 차이점
- 한국나이로. 우리나이로는 '세는 나이로'
- 사돈(査頓)의 처부처모(妻父妻母)는 남남 간
- 매제(妹第)는 여동생의 남편이 아니라 남동생과 여동생
- 최진실, 예절(내외법)만 지켰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 학덕과 사상을 기리는 제례에는 뢰주관지안해
- 기제사를 지내지 않을 경우
- 기제사의 날짜는 기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
- 정해진 혼인날과 조상제사
- 봉제사는 상하서열에 따라서 지내야
- 回甲때. 남자는 절 두번. 여자는 네번 절해야
- 부조금봉투. 속 종이위에 “爲”字
- 결혼한다' 결혼했다'라는 해괴한 일본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