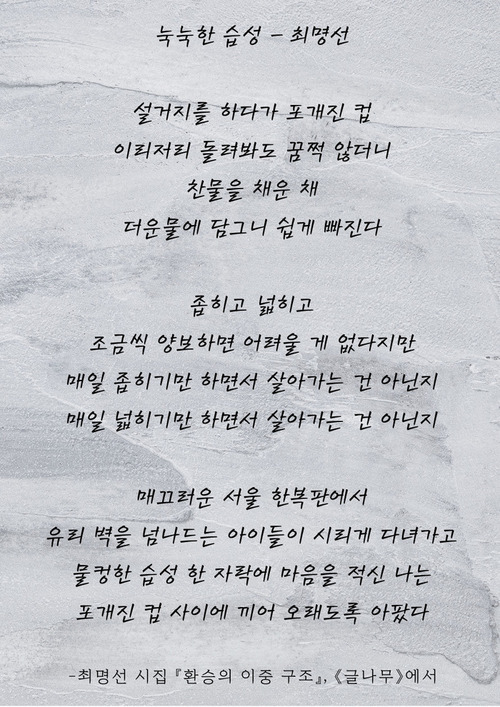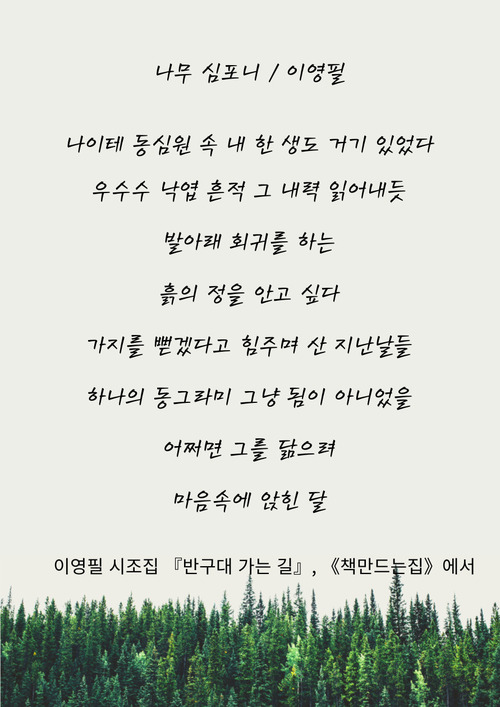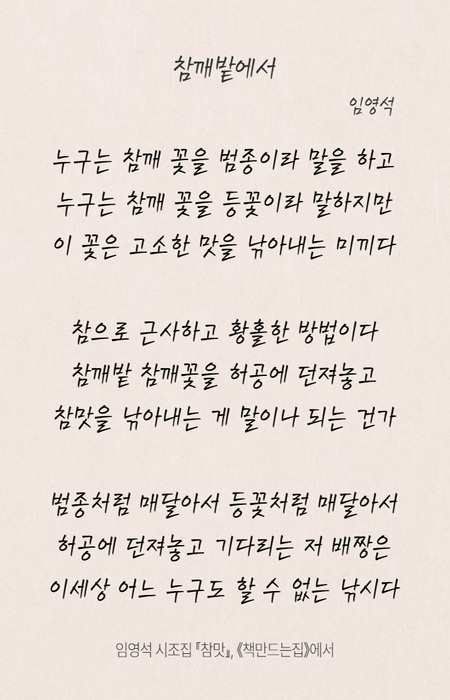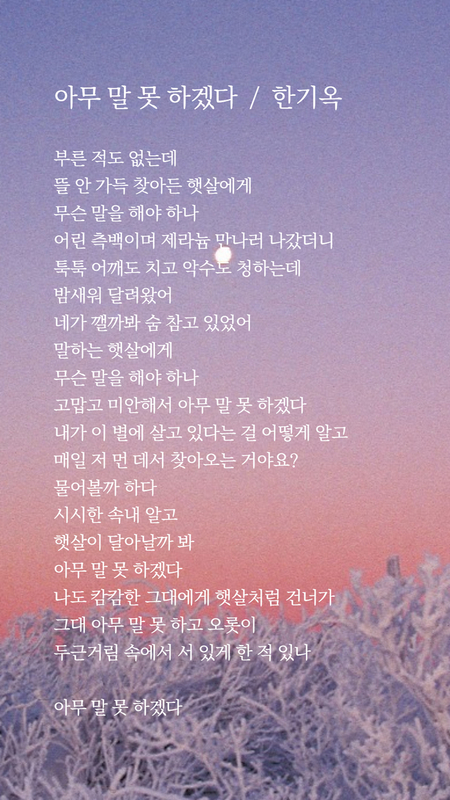현재 울산을 가르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 태화강 한가운데 아주 큰 백사장이 자리하고 있었다면 울산의 과거를 모르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으나 그 백사장은 울산의 본토박이들에겐 유년의 추억들이 담긴 곳이다.
|
|
| ▲ 씨름대회가 열리던 모래사장이 있던 위치, 산책로 일부도 모래사장이었다. |
현재 태화다리에서 시가지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서부터 백사장이 삼각지 형태로 존재했었고 그 백사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강물이 합류했다가 다시 모래사장이 아닌 삼각지가 있었다.
이 삼각지에는 일부분 채소가 경작되었지만 그냥 잡풀이 무성하던 곳으로 종달새가 여기저기에서 알을 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들은 그 종달새 알을 찾아서 풀밭을 헤매고 다녔고, 종달새 알을 찾으면 집으로 가져가서 따뜻한 곳에 두면서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렸지만 종달새는 부화되지 않았고 번번이 썩어버린 종달새 알을 버리기가 일쑤였다.
또 거기에는 누가 심었는지는 몰라도 박하풀이 많았다.
우리는 이 박하 풀을 뜯어 코에 대면서 신기해했었고, 멱을 감다가 지치면 이곳으로 와서 박하 풀 향을 맡으며 오수를 즐기기도 했었다.
이곳 태화강 백사장에는 그 모래가 얼마나 깨끗하였으면 우리들이 멱을 감고 백사장에 누웠다 일어나 모래를 털면 몸에 사금이 노랗게 묻어나는 그런 일급 백사장이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유년기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추석 한가위를 전후하여 씨름대회와 투우대회가 열려 우리들을 열광시켰다.
모래사장 한가운데 가마니를 연결한 가설대회장을 만들어 밤늦도록 씨름대회를 하였는데 이 씨름대회가 열리는 4~5일 간의 태화강은 온통 축재무드가 되어 흥청거렸다.
이 씨름대회가 열리는 가설대회장 앞에는 천막을 친 국밥집 겸 술을 파는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흥청거렸고, 입구 곳곳에는 소위 야바우꾼들이 몰려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뺑뺑이돌리기와 윷놀이 등이었는데 그 자리에 놓인 푸짐한 상품에 욕심이 생겨 그 앞에 앉는 날에는 집에서 얻어온 용돈은 삽시간에 털리기가 일쑤였다.
거기에는 비단 우리들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앉아서 그 사행놀이에 빠졌었는데 돈을 꽤 날린 사람들은 그곳 주인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우는 장면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어디서 끌어왔는지 전등불이 밝혀졌고 전등불을 구하지 못한 상인들은 카바이트 덩어리를 용기에 담아 물을 넣어 아세틸렌으로 만들어 불을 밝혀서 장사를 하였다.
어른들은 씨름대회를 관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흥청대는 분위기에 빠져서 술을 마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농악놀이가 이곳을 휩쓸고 가는 밤에는 이 농악소리에 흥이 난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농악놀이패들을 쫓아다녔다.
집에서 씨름판을 구경한다고 돈을 받아 나온 우리들은 뺑뺑이돌리기에 돈을 모두 써버린 탓에 표를 사지 못하고 씨름판 주위를 빙빙 돌다가 누군가가 뚫고 들어가자는 제안을 하면 씨름판을 에워싸고 있는 가마니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가마니와 가마니를 연결한 끄나풀을 한 장 풀어내면 우리들 몸이 쏙 들어가는 틈이 생기는데 그곳으로 우리들은 뚫고 들어가서 씨름판을 관람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도 재수 없는 날에는 이곳 씨름판 주위를 경비하는 아저씨에게 들키기도 했는데 그 아저씨 손에는 1m쯤 되는 새끼줄이 여러 개 들려 있어서 이 새끼줄로 등쭉지를 맞고는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야 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히히닥거리며 이곳 씨름판 주위를 싸돌아다니다가 거의 자정 무렵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특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네 어른이나 형이 씨름대회에 출전한다는 소문이 도는 날에는 우리는 저녁 먹기가 바쁘게 씨름장으로 달려갔다. 씨름장에서 이번에는 어느 선수가 출전한다는 확성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우리들이 아는 분의 이름이 호명되면 환성을 지르면서 바짝 앞으로 다가가서 씨름을 관전하다가 우리들이 아는 동네 분들이 이기면 흡사 우리가 이긴 것 마냥 환호를 하며 기뻐서 날뛰었고, 지면 풀이 죽어 시큰둥해져서 괜히 모래만 발로 걷어차곤 했었다.
|
|
| ▲ 박하풀이 자생하던 삼각지가 있던 곳, 종달새가 높이 떠서 우짖던 곳이다.) |
그리고 이곳 태화강 백사장에 투우대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축제분위기는 씨름판과 거의 같았다. 대략 4~5일 간의 일정으로 투우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소들은 촌에서 제법 용맹이 있기로 소문난 소들만 출전을 하였다.
우리들은 출전한 소들이 그냥 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키우다가 이러한 행사 때 한 번씩 출전하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뒤에 소문을 듣기에는 전문적으로 투우대회에만 출전하기 위하여 키우는 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승 범위 안에 들어가는 소들은 어딘가 귀족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저것도 전문적인 투우용으로 기른 소 맞제?” 하며 나름대로 참가한 소들을 품평하기도 하였다.
우리 집안의 먼 친척 중에 반탄골 아제란 분이 한 분 계셨다. 이분은 그 당시 필자가 보아도 우직스럽고 그냥 농사만 천직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 어른 집에 황소가 한 마리 있었다.
아제는 씨름판이 있는 해에는 어김없이 이 황소를 끌고 투우장에 나타나시곤 하였다. 그리고는 막걸리 몇 사발에 얼근히 취기가 오르신 아제는 자기의 소가 출전하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임마! 더 힘껏 받아 뿌리라 힘껏!” 하면서 고성을 지르곤 했는데 아제 소가 지고나면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제의 황소를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투우대회에서 그 아제 황소가 한 번도 이기는 것은 볼 수가 없었다.
결승전이 가까운 날에는 인근 시ㆍ군에서 이름이 쟁쟁한 소들이 많이 출전하였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출전하여 우승한 소라며 소들을 소개하는 마이크 소리가 날 때 마다 장내는 우우 하는 환성이 울렸고 그 소의 주인은 손을 들어 환호에 답하는 것이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것 같았다.
그러한 소의 등에는 언제나 예쁘게 수놓아진 누런 휘장이 덮여 있었다.
결승전에는 이들의 소가 내뿜는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어우러져 태화강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곤 했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유년이 뒹굴던 사금이 반짝이던 백사장도 이젠 없어지고 준설작업으로 모래를 퍼 올리는 모래 채취기만이 강변 둔치에 모래를 퍼 올리고 있다.

 花鶯)의 묘가 있어
花鶯)의 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