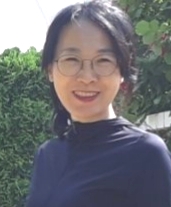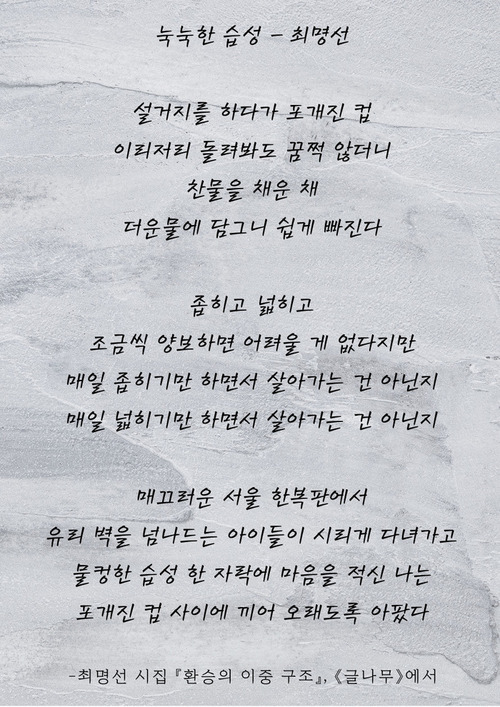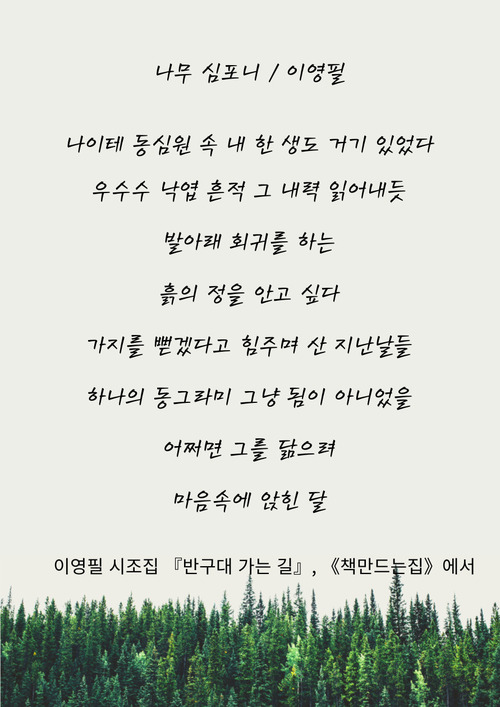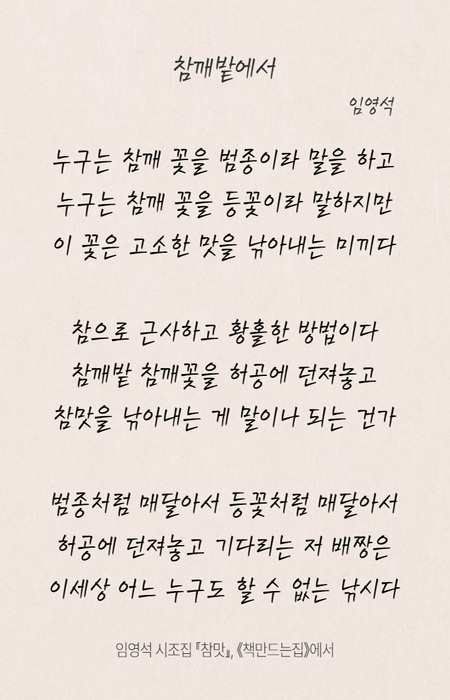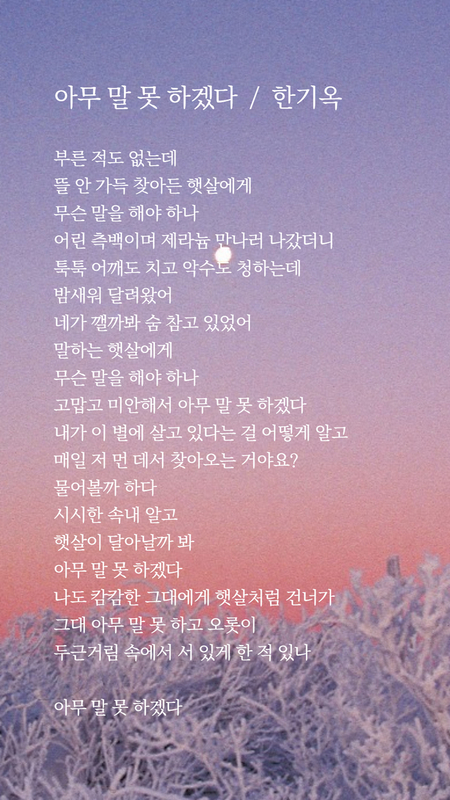산중 만하린에 여명이 밝아왔다. 숙소에는 난로도 없기에 새벽이 되자 제법 쌀쌀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침낭 속에 들어있는 모양이 어째 번데기를 닮은 듯해서 혼자 쿡 하고 웃었다. 오늘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한다는데 나비라도 되어 팔랑팔랑 날아가면 좋겠다.
전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지난밤에는 한밤중에 잠이 깨었다. 문밖을 나오니 하늘에는 별들이 말똥말똥 잠도 자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깜깜해서 혼자서는 길 건너편 화장실까지 갈 용기는커녕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도 못하고 결국 노상방뇨를 하고 말았다. 고맙게도 별들은 자기들이 본 비밀을 지켜주었다.
날이 밝아 오자 물이 귀한 곳이라 머리도 감지 못하고 간단히 세수 정도만 하고는 짐을 챙겼다. 호세가 챙겨주는 토스트와 주스로 아침을 먹으며 "어젯밤 개들이 이쪽과 저쪽에서 ‘아우’ 하는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니 하모니가 아주 환상적이었다"라며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너스레를 떨었더니 다들 맞장구치며 개가 아니라 늑대와 함께 한 듯하다며 웃었다.
친절한 호세는 길을 나서는 우리들을 일일이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 꼭 안아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기부제로 운영되는 알베르게라서 정해진 숙박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이곳에 머물 다음 순례자와 호스피탈레로를 위해서 성의껏 놓고 나왔다.
출발하여 막 나서려는데 지프차를 타고 온 한 사람이 도착했다. 호세와 잘 아는 이웃 주민인 듯했다. 우리를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며 차 트렁크에서 하몽을 꺼내더니 칼로 쓱쓱 길쭉하게 삐져서 주었다.
스페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서 건조한 거라고 하는데 식품 가게에 들어가면 소시지와 함께 돼지 뒷다리를 가게 천장에서 아래로 매달아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일 년 내내 먹을거리가 되기에 돼지를 도축하는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긴다고 했다.
나에게 하몽을 내밀며 먹어보라고 했다.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맛이 없는 표정을 보여서는 아주 실망할 듯했다. 설명을 계속하는데 스페인어를 모르지만 하몽 중에서도 우수한 하몽인 듯했다. 표정만으로도 얼마나 그 하몽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맛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시 차로 가더니 아주 귀한 건데 잘 먹는 걸 보니 또 주는 거라며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닌가. 사양할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넙죽 받았다. 서로 ‘부엔 카미노!’ 인사를 하고 걸음을 옮겼다. 현지의 음식을 맛보고 인정하는 게 여행의 묘미이긴 한데 나는 미식가가 되지 못하니 다 먹지는 못하고 뭐든지 맛있게 잘 먹는 ‘한’에게 슬그머니 양보를 했다.
며칠 동안 바람 한 점 없는 땡볕에 힘들었는데 오늘은 바람도 불고 그늘도 있어서 걷기에 좋은 날씨였다. 사방이 온통 산, 산, 산,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어제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묵었기에 오늘은 내려가기만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처음에 한 시간 남짓 오르막이고 나머지는 계속 내리막이었다. 산길이라 그런지 카미노에는 순례자들이 많지 않아서 산길에서 만난 사람이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다들 버스로 건너뛰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울퉁불퉁한 돌이 많은 곳이라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다칠 수 있기에 스틱의 도움이 컸다.
카미노를 도보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이곳에 와서 알았다. 평지에서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긴 하지만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오르느라 오히려 도보 여행자들보다 훨씬 힘들어 보였다. 자전거에는 수리할 수 있는 기본 연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길에서 자전거를 손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알베르게 중에는 자전거 보관함이 갖춰져 있는 곳도 많다.
외발자전거로 여행하는 이도 있다고 하니 거기에 비하면 도보는 그나마 쉬운 게 아닌가 싶다.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길에서는 미리 소리를 내어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간혹 바로 뒤에서 휙 하고 지나갈 때에는 깜짝 놀랄 때도 있다.
산길을 돌고 돌아 내려가니 멀리 산기슭에 마을이 보였다. 지금까지는 주로 붉은색 지붕이었는데 그 마을의 지붕은 진한 회색이었다. 마을을 보니 이쯤에서 그만 걷고 푹 쉬고 싶었지만 다시 걸음을 옮겼다.
폰페라다에 도착해서야 오늘 우리가 넘어온 산이 레온 산이고, 고개를 세 개나 넘어온 거라는 걸 알았다. 이곳 폰페라다는 고대 로마가 에스파냐를 지배하던 시기에 중요한 광업 중심지여서 채취한 다양한 광물을 로마제국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한’은 오늘따라 우리보다 한참 차이 나게 뒤에서 걸어왔는데 알베르게를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우리와 다른 곳에 묵게 되었다. 우리가 묵은 알베르게에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많이 달지 않은 치즈케이크가 있는 곳이었는데 한국인은 우리 둘뿐이었다.
푹 쉬고 내일 또 걷는 것, 계획이 퍽 단순하다. 산길 22km를 걸었는데 다행히 몸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다. 신발 오른쪽 뒤꿈치 안쪽이 해어진 걸 보면 멀쩡한 건 아닌 것 같지만 2~3주까지가 고비라고 하니 내 몸이 잘 적응하면 좋겠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방금 지나갔다. 나의 ‘뜻 모를(?) 이야기를 남긴 채’ 아침이면 이곳과 헤어진다. 날마다 헤어짐이며 동시에 날마다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산티아고 순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