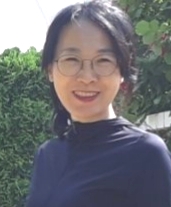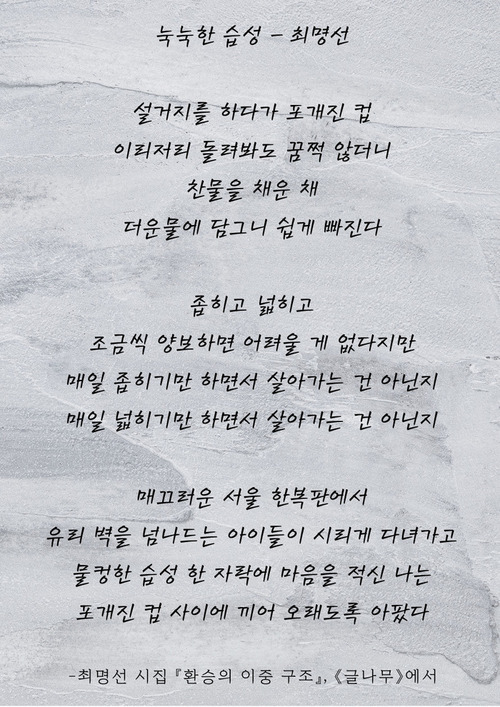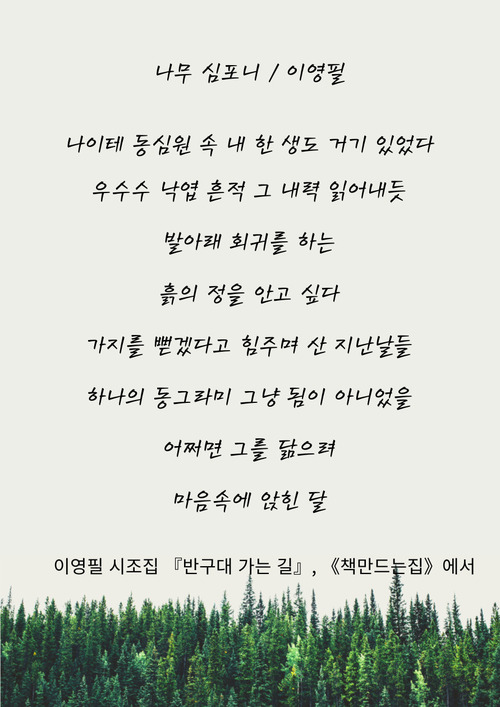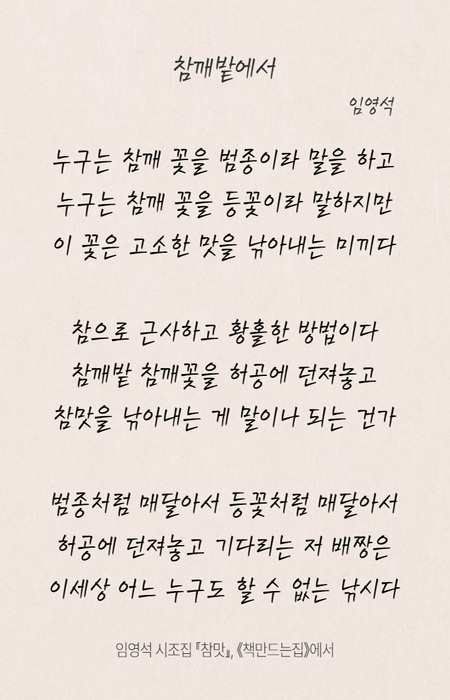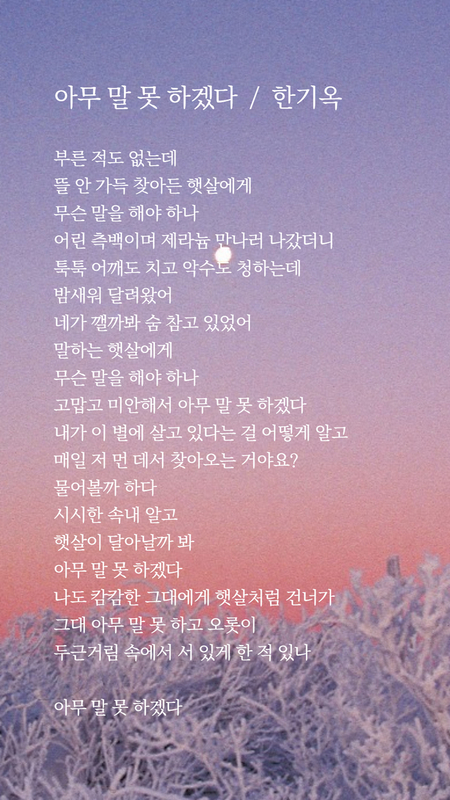이제 카미노 여정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새나라의 어린이가 된 것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이른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가 하면 침대에서 나는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익숙해졌다. 매일 20km가량 걷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서 여행이 아니라 고행으로 여겨질 때도 많지만 오늘도 포기할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알베르게에서 오렌지주스와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나섰다. 아침은 꼬박꼬박 밥으로 챙겨 먹어야 했던 나였는데 빵이나 시리얼만으로도 아무 탈이 없다. 식습관조차 ‘나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내왔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나 자신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어제 산을 많이 내려왔더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걷다 보면 풀어지기 마련이니 그냥 출발하기로 했다. 어젯밤 다른 알베르게에서 묵은 ‘한’과 만나기로 했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동행이 자연스러워졌다.
동틀 무렵에 나섰더니 손끝이 조금 시렸다. 겨울철에 오는 순례자들은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겠지만 스페인의 가을 날씨에 적응하다가 추워지니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서머타임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나서 한 시간 늦춰졌기도 하니 느긋한 마음으로 출발 시간을 좀 더 늦춰도 되겠구나 싶었다.
대성당을 지나 도심을 벗어나려니 아주 견고해 보이는 성이 우뚝 서있는 게 보였다. 해자도 되어 있고 위치도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있었다. 저 멀리 산을 넘어오는 적을 발견하기에도 좋을 듯했다.
이곳 폰페라다는 템플 기사단이 지키던 곳이라고 한다. 하다못해 공사장 가림막에도 중무장한 중세 기사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을 쌓아야 할까. 빼앗기 위해 공격해오는 적이 없으면 높은 성벽을 만들 일도 없을 텐데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평화는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
도시를 벗어나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었다. 도심의 오른쪽으로 완전히 빙 둘러서 빠져나가기에 왜 그렇게 일부러 돌아갈까 의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례길이 원래 구(舊) 시가지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빤히 보이는 직선을 두고 구불구불 돌아서 가려니 멀긴 하지만 그렇다고 날아갈 재주는 없으니 묵묵히 가는 수밖에.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고도 한다. 이곳 카미노는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에 찾기 위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편안한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길이라 갑갑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생기와 설렘은 새로운 것에 많이 있으니까.
작은 자갈이 섞인 건조하고 밝은 색의 흙길이라 길만 보며 걸으면 눈이 조금 피로해지기도 했다. 다행히 눈만 들면 멀리 산이 있고 양쪽으로 푸른 나무와 풀이 있어서 피로를 덜어주었다. 걸을 때마다 자잘한 자갈돌이 빠스락빠스락 소리가 났고 단단한 느낌이 발바닥 아래에서 전해왔다.
여러 개의 마을이 지나오느라 지루할 틈이 없었고 길가나 건물 벽에 그려놓은 그림을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어느 때부터 마을 지붕이 검은색이 많은데 여전히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하니 무심해지고 그 가치를 알 수도 없는데 나의 무지함은 그 방향이 참 다양하기도 하다.
한동안 뜸했던 포도밭이 이어졌는데 이 부근은 완만한 산지였는데 멀리까지 눈에 보이는 곳은 온통 포도나무에 울긋불긋 곱게 물들어서 장관이었다. 과수원에서 자랐지만 포도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예쁘게 물들 줄은 몰랐다. 단풍놀이라도 나온 듯했다.
한 번은 한이 뒤로 처지는가 싶더니 안 보였다. 동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없이 사라지면 그것은 볼일을 해결하러 갔다는 신호였다. 이곳 순례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어서 마을에 들르면 카페 화장실을 이용한다.
특히 마을이 띄엄띄엄 있고 가릴 곳이 없는(?) 메세타 구간에서 곤란한 점 중 하나는 화장실이다. 나와 딸은 둘 다 다행스럽게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그런지 슬그머니 사라져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일이다.
점심을 먹으러 카페에 들러 먹고 있자니 오늘따라 현지인들이 많았다. 우리가 점심을 다 먹을 때쯤에는 밖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라도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날이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줄을 선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고 나왔다.
한이 지나는 할머니께 물어보니 오늘이 ‘세인트 데이’로 스페인 국경일이라서 쉬는 곳이 많고 다들 집이 아니라 식당에 나와서 먹는다고 했다. 경건한 날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가 보다. 신 앞에서 겸허해지고 엄숙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듯한데도 무 신앙자인 나로서는 성스러움, 신성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특정인의 문화로 여겨졌다.
늘 유쾌하여 농담을 즐겨 하는가 하면 장난기도 많은 ‘한’도 하루의 피곤함을 떨치고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저녁 미사는 빠지지 않고 간다. 아주 다소곳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한을 보니 나에겐 그저 하룻밤을 쉴 수 있는 숙소이고 뜻하지 않은 생고생 길(?)이지만 한에게는 성지이고 순례길로 여겨지는 듯했다.
24.1km를 걸어서 비야프랑카 델 비에르소(Villafranca del Bierzo)에 도착했다. 고풍스럽고 견고해 보이는 성과 아래로 펼쳐지는 마을, 그리고 우리가 묵는 알베르게 성당의 중후함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걷느라 힘들 때는 ‘내가 여기 왜 와있는가’ 싶다가도 도착하면 ‘그래도 고생을 사서 할만하다’ 싶으니 내일을 또 용기 내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