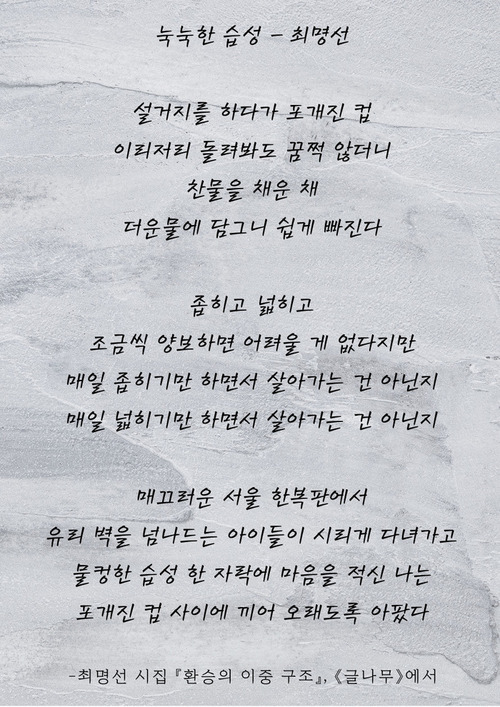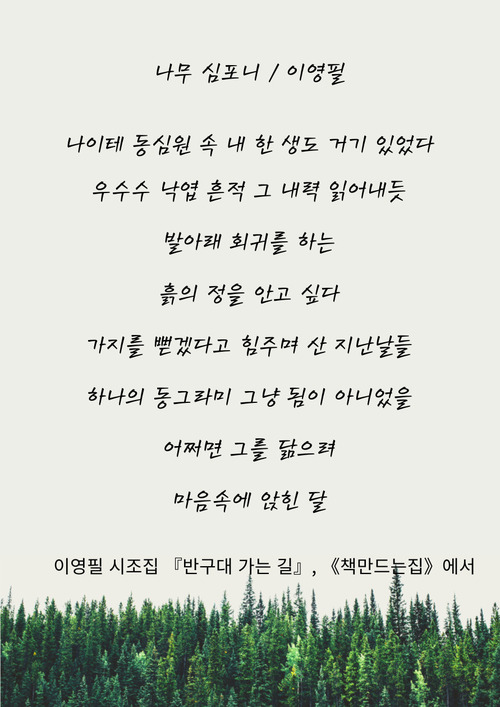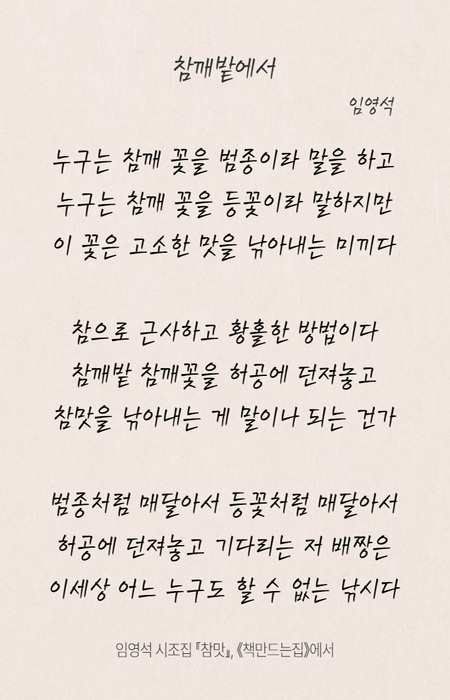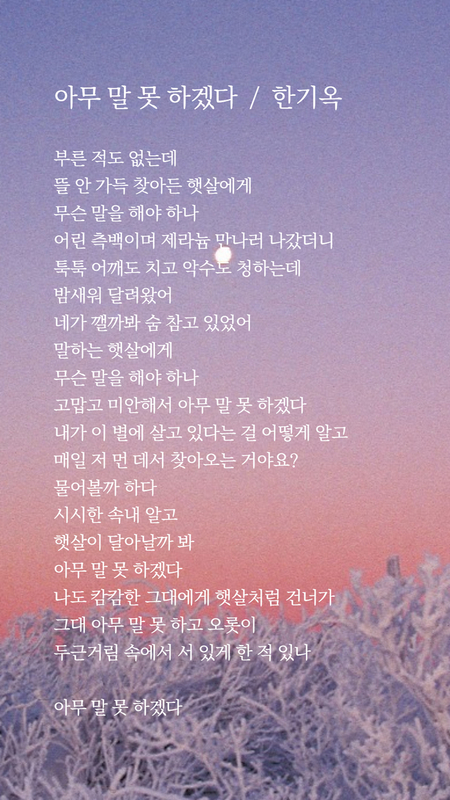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카미노 13일째 도착한 이곳은 스페인 북부에 있는 부르고스(Burgos)라는 대도시로 옛 카스티야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알베르게도 많고 시설도 좋은 편이지만 와이파이는 되지 않아서 카페에서 글을 써야 했다. 발은 순례 길에 닿아 있지만 오늘도 와이파이를 찾아 더듬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인터넷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가까운 이들에게 무사함을 알리고자 가볍게 시작한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날씨가 흐린가 싶더니 다시 맑아졌고 바람도 약하게 불었다. 아침 기온이 14도라 걸을 때는 짧은 소매를 입고 다니다가 쉴 때는 다시 점퍼를 입는 정도였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벌써 털모자 달린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넓은 들판을 지날 때 저 멀리서 뭔가 돌무더기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 양 떼였다. 무리를 지은 채 제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체득한 생존 방식일 것이다. 평소 얌전한 성격이 못되고 사람들과 뭉치는 것에도 영 시원찮았는데 양들의 얌전한 무리 지음이 슬쩍 부러운 걸 보니 산티아고에서의 풍경이 나를 향해 계속 돌이라도 던지는가 보다.
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말끔한 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풍성한 결실 뒤에 휴식을 취하느라 대지가 조용했고, 그 위로 바람도 부드럽게 지나고 있었다. 돌길로 된 조금 높은 산길을 한참 오른 끝에 산 아래로 보니 멀리까지 탁 트인 풍광이 펼쳐졌다. 마침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막 비치려던 참이어서 하늘빛은 너무 멋졌는데 사진으로는 풍광을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했다.
부르고스 초입은 대단지 산업공단 같았다. 대형트럭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고 철도역에도 많은 물량의 화물이 적재돼 있었다. 한참 지나니 시가지가 나타났는데 그곳을 가로지르는 데만 2시간은 족히 걸린 듯했다.
배가 고파서 카페에 들러 일단 점심을 먹기로 했다. 부르고스는 2015년에 유네스코가 ‘미식(美食)의 도시’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우 시장했던 터라 미식가의 고상함은 어디로 가고 포식이라도 할 태세였다. 보통 점심은 빵과 오렌지주스 정도로 가볍게 먹는데 오늘은 새우에다 계란 요리 등 아주 푸짐하게 먹었다.
도시를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바로 부르고스다’라고 전격 선언하듯 훅하고 나왔다. 산뜻하면서도 원색적인 건물들이 이어져서 마치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뎌본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스페인 기행’에서 부르고스라는 도시에 대해 ‘영웅적인 부르고스는 많은 조각과 날짜가 새겨졌지만 정작 칼은 없는 장엄한 칼집처럼 살아남아 있다’라고 했다. 칼이 없는 칼집의 살아있음은 어떠할까? ‘영웅’의 명예는 무엇으로 지켜질까? 날 선 용기만으로는 자칫 자신을 향해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저것 상상을 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화려하면서 웅장한 고딕 양식의 부르고스대성당이 나타났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원래 입장료가 1인당 4유로인데 저녁 4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너도나도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간다고 했고 우리도 시간에 맞춰 관람하기로 했다. 대성당 앞에서는 각자 따로 왔지만 카미노 친구가 된 사람들이 마치 번개 모임처럼 즉석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성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딱 벌어졌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감탄과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예술작품 자체인 듯했다. 성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내게도 그 두드림의 울림이 느껴졌는데 건축미도 매우 뛰어났다.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딸로부터 "우리 엄마 오늘 또 온종일 걸리겠네."라는 타박을 듣고서야 성당을 나왔다.
우리와 동행했던 ‘한’은 한 이스라엘 여행자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물었다가 그냥 종교가 있느냐고 물어야지 크리스천과 비 크리스천으로 질문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어쩌다 종교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대상 앞에 설 때의 그 순수함이나 경건함, 용서, 평화, 사랑과 같은 의미가 그저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싶었다.
날마다 이어지는 카미노에서의 도착지는 십자가였다. 길에서도 수없이 만나기도 하지만 멀리서 성당의 십자가가 보이면 그곳이 그날의 푯대였고 휴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했다.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간 끝에 그제야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카미노를 걷기 시작한 지 13일 지나는데도 내일 무엇이 기다릴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걷기에만 열심이다. 뜻하지 않은 것과 만나는 신선함의 즐거움이 쏠쏠하다. 내가 왜 이 길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지, 걷기 위해 왔는지, 걷다 보니 걷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르고스라는 대도시에서도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 글ㆍ사진 정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