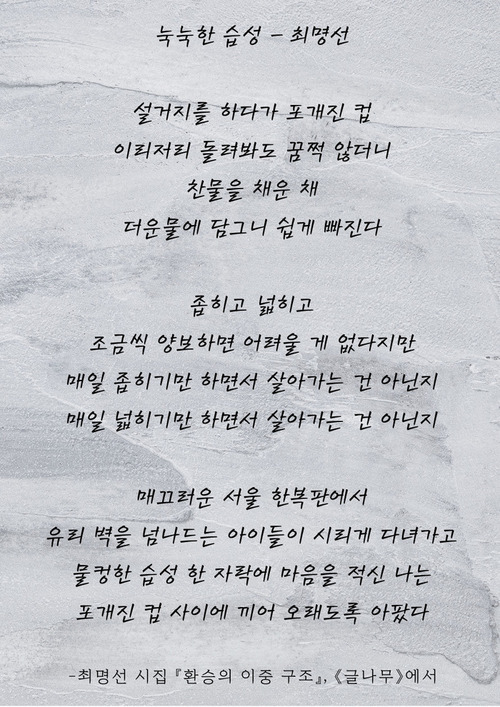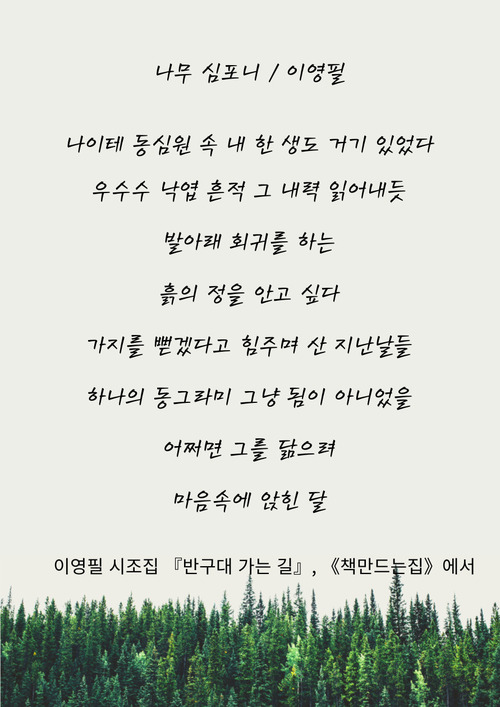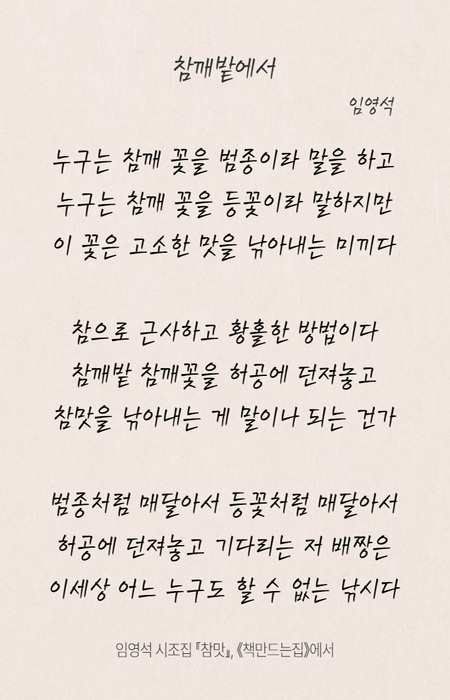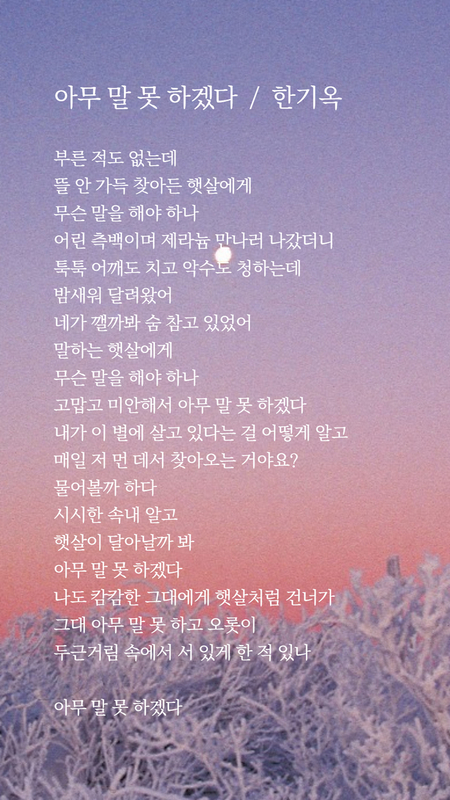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 ▲ 로그로뇨 시가지 들어가기 전 아치형 다리 © UWNEWS |
|
[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산티아고 카미노를 걷기 시작한 지 8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충전된 걸 보면 잠든 사이에 ‘에너지 1일 패스권’ 선물을 놓고 가는 천사라도 있는가보다. 밖을 보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대도시 로그로뇨를 거쳐 나바레떼까지 22킬로미터를 걷기로 했다.
날이 갈수록 알베르게에 자신의 물건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새털 하나만 더 얹어도 주저앉을 듯 힘들 때가 있으니 욕심이 들어간 짐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배낭의 무게가 삶의 무게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짐을 감당하며 장거리를 걷다 보면 버릴 것과 짊어지고 가야할 것의 구분이 갈수록 확연해진다.
짐을 단출하게 챙겼다고 여겼지만 나에게도 버릴 것이 있었다. 판초가 있으니 우산을 버렸다. 평소처럼 용도에 따라 갖춰 쓰던 세제도 줄여서 샴푸 하나로 샤워와 빨래를 했다. 겉옷과 속옷은 각각 두 벌만으로 버텼기에 빨래는 하루도 미룰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땀에 절인 옷을 다시 입어야한다.
누군가는 빨랫줄을 딱 필요한 만큼만 두고 잘랐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양말의 목이 긴 것을 잘라냈다고 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한 저마다의 고군분투에 공감의 웃음을 함께 나누었다.
살다 보면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는데 나는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알고 보니 이곳에는 배낭을 부치는 ‘동키서비스’라는 방법도 있었다. 원하는 알베르게와 자신의 이름을 봉투에 써서 요금을(5~7유로 정도) 넣고 배낭에 매달아 두면 도착해서 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침낭을 비롯해 무거운 짐은 부치고 낮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작은 가방에 넣고 걸으면 된다고 했다.
배낭을 맡기고 알베르게를 출발할 때만 해도 이슬비였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모자를 챙겨오지 않아서 며칠 전엔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 썼건만 이번에는 신발이 문제였다. 마치 옆 동네 오듯 방수가 되지 않는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왔으니 비에 젖게 되면 걷기가 힘들고 말리기도 힘드니까 조치를 취해야 했다.
| ▲ 운동화가 비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과 테이프로 감싸고 전진 ©UWNEWS |
|
가방에 있던 비닐봉지를 꺼내어 신발을 감싼 후 반창고와 테이핑 밴드를 붙였다. 우스꽝스런 신발을 본 딸은 "역시 비주얼은 무시, 완벽하게 기능만 살렸네요."라고 했다. 솜씨가 있든지 없든지 해결을 해야 했기에 뭐라도 한 것이었는데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발이 퉁퉁 불어서 걷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오늘도 지하도나 벽에는 앞서간 여행자들의 메시지를 비롯해 멋진 그림 작품들과 카미노 지도를 그려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작품은 시간과 정성이 가득하여 순례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카미노 전체가 역사이자 문화였고, 봉사의 현장이었다.
와인의 주 생산지인 로그로뇨라는 곳은 대도시여서 하루나 이틀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로그로뇨 대성당에서 잠시 쉬었다가 걸음을 옮겼다. 깔끔하게 단장한 정원수가 도열해 있는 공원과 아치형 다리가 예뻤던 강을 지나 도시 중심지를 통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
다시 포도밭이 이어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을 걷다가 그라헤라 공원의 근사한 호수를 낀 바(BAR)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풍경이 좋은 곳은 발길을 멈추게 한다. 미국에서 왔다는 노신사는 아내가 어딜 가든 좋은 곳만 보면 집 짓고 살고 싶다고 한다면서 아무래도 트럼프처럼 부동산 재벌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나 또한 무얼 그리 찾는 건지 어딘가 떠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정착할 곳을 찾는다. 가슴 속에 바람 하나를 안고 사는 듯하다.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 잔잔한 호수에는 백조가 평화로이 놀고 있었다. 눈앞의 평온한 정경들을 보니 욱신거리던 근육들과 피로감이 위로받는 듯했다. 멀리서 보면 우아하게 떠있는 하얀 백조가 실은 발은 바삐 움직인다고 한다. 어쩐지 백조의 수면 아래 발버둥에 더 마음이 갔다.
산티아고에서의 사진을 본 지인들은 풍경이 좋다며 매일 20킬로미터 넘는 도보로 인한 고단함조차 부러워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감내하는 걸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수고로움을 향해 일단 응원하고 싶다.
| ▲ 1645년에 완공되었다는 성모 승천 성당 © UWNEWS |
|
이후부터는 쉬지 않고 걸어서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 나바레떼에 도착했다. 1185년에 순례자를 돕기 위해 산 후안 데 아크레 병원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둘러보지는 못했다. 알베르게 근처에는 1645년에 완공되었다는 성모 승천 성당도 있었다. 가톨릭의 3대 성지로 불리는 순례길이라 성모마리아의 이름으로 된 성당은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었다.
비 오는 날의 도보라 온몸이 눅눅했는데 샤워를 하고 나니 조금 살 것 같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산티아고의 카미노가 나를 이끄는 듯하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길 끝의 내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