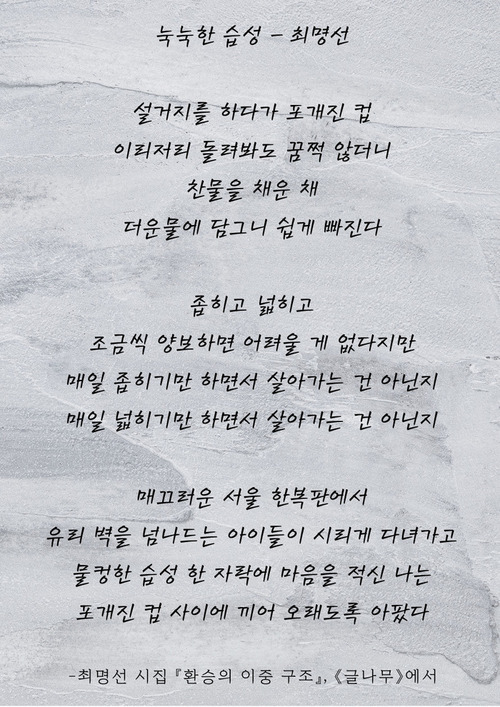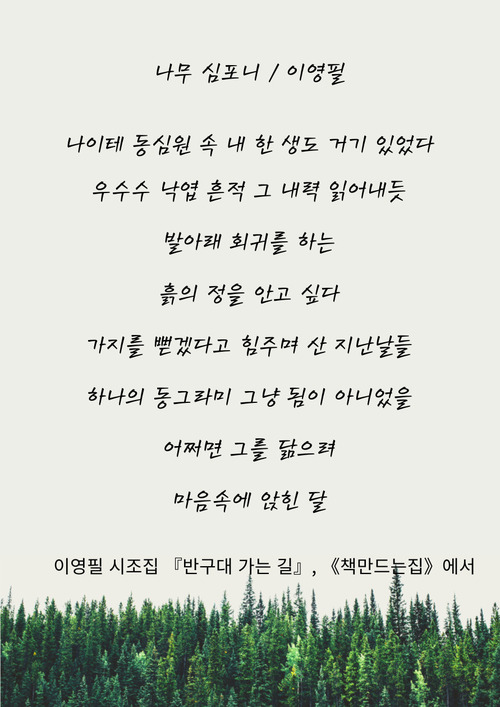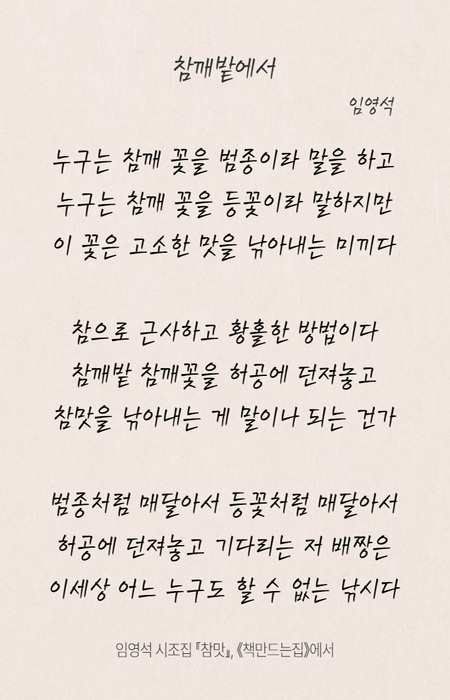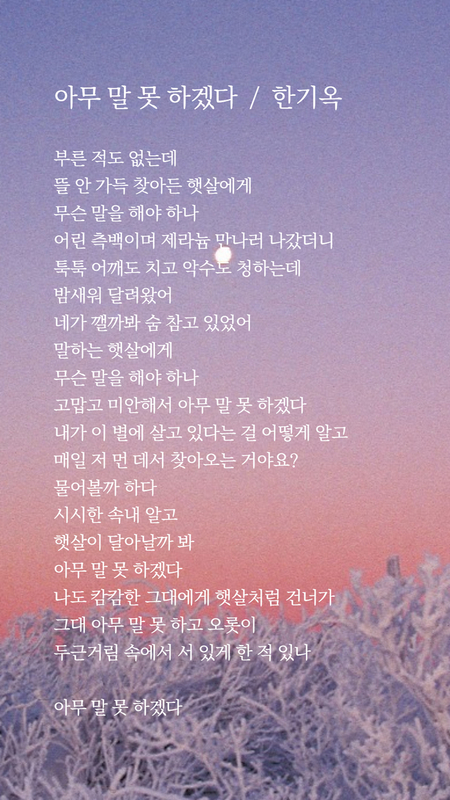“사흘도 못 가서 포기하고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가야해요.”
[울산여성신문 정은주 객원기자] 45일간의 산티아고 여행에서 돌아온 지 4년이다. 4년 전 이날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해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다. 도보 중에는 스스로에게 별로 물어본 것이 없었고, 생각을 생각보다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성 야고보의 길(el camino de Sant Iago)’, 약 800킬로미터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행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다. 종교적인 이유로 순례길에 오르는 이도 있겠으나 내면의 어떤 길을 찾아 떠나는 이도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길이다. 나에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와 현재의 나와 조우하며 어느새 ‘나의 길’이 되어 있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여행안내서와 글은 많다. 나는 누군가의 여행을 가이드 할 정도의 위인이 되지 못 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어느 여행가에게 어떤 여행이 가장 좋았냐고 우문했더니 ‘지금의 여행’이라고 답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는 최고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누군가의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여행 고백’일 수밖에 없다.
평소에 800미터 걷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에 용기라고 하기에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여행이었다. 육체적 피곤함은 물론이고 인터넷 상황이 열악하였는데도 매일 일기를 써서 기록을 남겼다. 무슨 대단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단지 준비도 없이 훌쩍 떠난 나를 걱정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해 보낸 최소한의 편지였고 우체통이었다.
이제 4년 전 그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4년 전 나와 교감하기로 한다.
나에게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은 사건이었다. 아무래도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앙인도 아니었기에 순례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처럼 야심차게 써 둔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산티아고에 대해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산티아고로 갔다.
대학생이 된 큰딸이 휴학계를 내고 산티아고를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종교인도 아닌데 왜 순례길을 걷고 싶을까도 싶었지만 성인이 된 딸이니 잘 다녀오라며 격려해주었다. 하지만 출발 5일 전에 가볍게 물어보았다가 노숙이라도 하면 된다는 딸의 말에 아연실색했다. 평소 알아서 하라며 자유롭다 못해 헐렁하다 싶게 대하던 엄마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새삼스레 보호자로서의 사명감이 발동했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 비행기표를 끊었다. 황당해 하는 남편, 그리고 더 황당해 할 직장에서의 반응은 이미 예상했음에도 결정을 번복할 순 없었다.
“사흘도 못 가서 포기하고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가야해요.” 스스로도 왜 그런 무모함에 가까운 결단을 하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유를 따질 생각도 없었다.
4일 만에 두 달간의 일을 수습하느라 여행 준비는 할 겨를도 없었다. 평소 나를 알던 사람들은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산티아고로 간다고 하니 ‘갑자기 미쳤냐’는 반응도 있었고, ‘훌쩍 떠날 수 있음에 멋지다’는 응원도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누군가의 염려나 응원의 메시지를 고려할 틈도 없이 그냥 떠났다.
그 흔한 모자조차 챙기지 않았고 배낭도 가까이 살던 후배한테 빌렸다. ‘도보 여행이니 짐을 최소한으로 하자’, ‘꼭 필요하다면 거기서 사면 된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럼 됐다.’ 이것이 부실한 준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배낭 무게를 재어보니 5.5킬로그램이다. 일단 출발!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몇 개의 루트가 있지만 우리는 프랑스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급히 비행기 표를 구하다 보니 딸보다 하루 먼저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인천 공항에서 드골 공항까지 비행시간 11시간 40분, 누적된 피곤함 덕분에 오랜만에 푹 잤다. 파리 시내의 한인 민박집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묻고 또 물어서 찾아갔다. 만국공통어 바디랭기지까지 총동원했음은 물론이다.
파리에서의 2일째 아침, 숙소에서 나와 에펠탑 근처 잔디에서 기온 19도의 청명한 하늘을 느긋하게 즐기고, 센 강변을 따라 산책하기도 했다. 딸과 약속해 둔 장소에서 합류한 후에 버스를 타고 11시간을 이동하였고, 거기서 산티아고 프랑스길의 시작점이 되는 생장까지 또 기차로 이동했다. 자전거보다 조금 더 빠를까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가는 세 칸짜리 기차였는데 거의 대부분 순례길을 향하는 여행자들로 가득했다.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다.
생장에 도착하여 먼저 순례자 사무소에 들러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았다. 일종의 순례자들의 증명서라 할 수 있다. 순례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인 알베르게와 순례자들을 위한 식당을 이용하기 좋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충실히 예습(?)하고 온 여행자들에게서 얻은 정보였다. 우리만 빼고 다 알고 온 분들인 듯했다. 어쨌든 우리는 도착했다. ‘낯섦에 대한 셀렘’으로 나도 모를 내일을 기대한다.